[김부복의 고구려POWER 30]
[논객칼럼=김부복] 당나라 현종 때 반란을 일으킨 안록산(安祿山)이 부하 장수 윤자기(尹子琦)에게 수양성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윤자기는 13만 대군을 이끌고 수양성을 포위했다.
성을 지키던 장순(張巡)은 고민에 빠졌다. 거느리고 있는 군사가 고작 7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당해 낼 재간이 없었다.
장순은 성문을 굳게 닫아걸고 병서를 이것저것 뒤지며 궁리를 했다. 그러나 묘책은 없었다. 적이 한번 공격해올 때마다 군사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군량마저 바닥날 지경이 되었다. 성은 함락 위기에 놓이고 있었다.
장순은 간신히 병서의 한 구절을 찾을 수 있었다. “사람을 잡으려면 말을 먼저 쏘고, 적을 잡으려면 적의 두목부터 잡아라((射人先射馬, 擒賊先擒王).”
장순의 머릿속에서 느낌표(!)가 떠올랐다. 즉시 작전회의를 소집했다. 부하들에게 말했다.
“적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도저히 대항할 수 없다. 유일한 돌파구는 적장 윤자기를 제거하는 방법뿐이다. 윤자기를 제거하면 적의 세력도 꺾일 것이다.”
문제는 수많은 적 가운데 적장 윤자기를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성벽 밑에서는 13만이나 되는 적이 개미떼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 많은 적 가운데 누가 적장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장순은 다시 머리를 짰다. 드디어 방법을 생각해냈다.
장순은 부하들에게 마른 풀로 화살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적이 또 공격해오자, 마른 풀로 만든 ‘건초화살’을 사격하게 했다. 당연히 적은 화살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았다. 풀을 맞고 쓰러지는 적은 있을 수 없었다.
이 ‘희한한 작전’에 어리둥절해진 적의 병사 하나가 ‘건초화살’을 집어 들고 누군가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바치는 모습이 보였다. “적장은 바로 저 체격이 큰 자다. 집중사격해라.”
숨겨두었던 명사수들이 일제히 화살을 날렸다. 이번에는 진짜 화살이었다. 그 가운데 한 대가 윤자기의 왼쪽 눈에 꽂혔다.
장수가 부상당해 쓰러지자 적은 흔들렸다. 장순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곧바로 남은 병력을 모두 이끌고 출동했다. 순식간에 5천이나 처치할 수 있었다.
윤자기는 목숨만 건진 채 후퇴하고 말았다. 장순은 이렇게 수양성을 살릴 수 있었다.
장순이 윤자기를 물리친 것은 ‘36계 병법’ 가운데 18번째인 ‘금적금왕(擒賊擒王)’이었다. 적을 제압하기 위해 적장부터 잡는 방법이다. 그래야 적 전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 화근을 없애기 위해서는 뿌리를 제거해야 가장 확실한 것이다.
고구려를 침략한 수나라 양제(煬帝)가 병법을 몰랐을 리 없었다. 자칭 ‘병법의 달인’이었다. 그렇다면, 양제는 을지문덕을 잡아야 좋았다. 그렇지만 수나라 장군 우중문(于仲文)은 양제의 ‘생포명령’을 지키지 않고 ‘거짓 항복’하러 제 발로 찾아온 을지문덕을 놓치고 말았다.
그리고 양제 자신이 ‘금적금왕의 제물’이 되어야 했다. 그 장면이 통쾌했다.
고구려 영양왕이 양제에게 항복 사신을 보냈다. 물론 거짓 항복이었다. 고구려가 수나라 따위를 겁낼 까닭은 없었다.
사신은 양제 앞으로 갔다. 공손하게 항복문서를 바쳤다. 양제는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항복문서를 펼쳐들었다.
그 순간 사신을 수행했던 부하 무사가 품속에 감췄던 무기를 꺼내 양제에게 발사했다. 조그만 쇠뇌였다. 쇠뇌는 양제의 가슴 한복판에 박혔다. 수나라는 군사를 거둬 철수해야 했다.

쇠뇌는 일반 활처럼 잡아당겨서 쏘는 무기가 아니다. 화살을 미리 걸쇠에 걸어두었다가 퉁겨서 쏘는 무기다. 그래서 적중률이 높고 강력했다. 대형 쇠뇌는 사람의 몸을 관통할 정도였다.
사신을 수행했던 부하 무사가 쏜 쇠뇌는 작은 쇠뇌였다. 암살용 무기였다. 그렇다면 살촉에 독을 발랐을 것이다. 당연히 양제는 ‘전사’해야 했다. 그런데도 양제가 독 때문에 죽었다는 역사 기록은 없다.
당나라 태종 이세민(李世民)은 수나라의 실패 요인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고구려를 쳐들어왔다. 수나라의 참패를 ‘반면교사’로 삼은 것이다.
그렇다면, 양제가 쇠뇌에 맞은 ‘과거사’에 대한 대비책도 세웠을 만했다. 하지만 이세민 역시 안시성 싸움에서 눈알을 잃고 후퇴하고 말았다.
‘영화 안시성’에서는 양만춘 장군이 ‘주몽의 신(神)’이 깃든 화살을 날리는 것으로 묘사했지만, 이세민의 눈알을 빼앗은 것도 쇠뇌였다고 했다. 이세민은 쇠뇌의 ‘유효사거리’가 겁나서 멀찍하게 ‘안전지역’에 떨어져 있었지만 쇠뇌는 화살을 1000보나 날려 보내고 있었다.
이랬으니, 중국은 우리의 쇠뇌를 무서워했다. 신라가 삼한을 ‘일통’하자 당나라는 문무왕에게 쇠뇌의 ‘기술 이전’을 강요했다. 쇠뇌 기술자 구진천(仇珍川)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간 것이다.
당나라는 구진천에게 쇠뇌를 만들라고 했다. “너희 나라의 방식으로 만들어 바쳐라”고 요구했다.
구진천은 별 수 없이 쇠뇌를 만들었다. 하지만 발사해보니 쇠뇌는 불과 30보밖에 날아가지 않았다. 한 보는 두 발자국이다. 30보면 고작 50m다. 그 정도의 발사 거리로는 실전에 써먹을 수 없었다.
당나라는 구진천을 꾸짖었다. “너희 나라 쇠뇌는 1000보를 능히 간다고 들었다. 겨우 30보가 뭐냐.”
구진천이 핑계를 댔다. “쇠뇌를 만드는 재료 탓이다. 우리나라 나무로 만들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당나라는 신라에 나무를 요구했다. 신라에서 나무를 배에 실어 보냈다. 구진천은 쇠뇌를 다시 만들었다. 그래도 60보밖에 나가지 않았다. 역시 실전에는 사용하기 어려운 거리였다.
또 이유를 따졌다. 구진천은 태연했다. “아마도 바다를 건너오는 사이에 나무에 습기가 차서 그럴 것이다.”
구진천은 쇠뇌를 만들어주면 그것이 누구를 겨냥할지 알고 있었다. 만들어주지 않으면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알고 있었다. 그래도 버텼다. 구진천의 애국심이었다.
어쨌거나, 우리 역사에서 적국의 황제에게 화살을 명중시킨 ‘과거사’는 더 이상 없었다. 고구려의 파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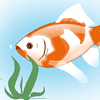
김부복
| 오피니언타임스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ews34567@opiniontimes.co.kr)도 보장합니다. |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