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8.12.26 07:30

[뉴스웍스=박준영 기자] 한국 게임산업이 위기에 몰렸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이는 이전에 구축한 토양 덕분일 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특정 플랫폼과 장르, 지식재산권(IP) 등에 집중하면서 혁신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큰 문제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난 10월 발행한 '2018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에 따르면 2017년 국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아 유통된 게임물은 57만 9113개다. 이 중 99.7%에 해당하는 57만 7431개가 모바일 게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업계 전체가 모바일 게임에 매달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 시장이 모바일 게임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집중 현상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장르와 IP도 마찬가지다. 신작 상당수가 매출을 올리기 좋은 장르로 평가받는 역할수행게임(RPG)이나 수집형 게임 등에 편중되고 있다.
현재 서비스 중인 게임 중에도 '리니지M'을 비롯해 '블레이드 & 소울 레볼루선', '검은사막M', '리니지2 레볼루션', '뮤 오리진 2', '다크에덴M', '미르의 전설 2 리부트', '프렌즈레이싱', '메이플스토리M', '라그나로크M', '이카루스M', '열혈강호M' 등 기존 인기 IP를 활용한 작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모험과 투자를 주저하는 기업과 투자 기관
게임업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적이 억울할 수 있다. 성공할 확률이 높은 곳에 집중하는 것은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으로서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이 게임 이용자의 반응이다. 안정적인 수익원에만 매달리다 보니 전반적인 게임 퀄리티나 업계의 발전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17년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2018년 '로스트아크' 등 전 세계적으로 호평받는 게임을 개발할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며 싸늘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

새로운 게임 개발로 업계에 뛰어들려는 이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아이폰 쇼크' 이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 모바일 게임은 PC 게임 못지않은 퀄리티를 자랑한다. 이용자의 눈이 높아진 현재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양질의 게임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게임의 소재나 기획, 완성도와 관계없이 투자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 신규 업체들의 반응이다. 모바일, RPG 등 매출을 뽑기 좋은 플랫폼 및 장르의 게임이 아니면 투자를 꺼린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현재 모바일 게임을 개발 중인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이 아니면 투자받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지난해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가 PC 게임으로 큰 성공을 거뒀지만 이러한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특정 플랫폼이나 장르의 게임이 상당수 성공하는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당연한 판단이지만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심화되는 부익부 빈익빈
부익부 빈익빈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 차이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3N'으로 불리는 넷마블·넥슨·엔씨소프트는 지난해에만 총 6조 482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한국 게임산업 전체 매출(12조 2403억원)의 약 53%에 달하는 수치다. 스마일게이트, 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구 블루홀) 등 여타 대기업의 매출까지 합하면 그 차이는 더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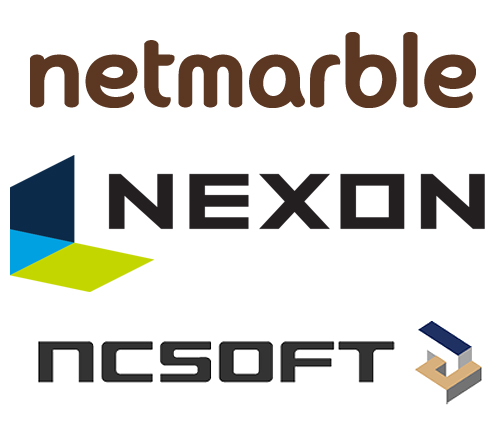
과거 '애니팡'의 선데이토즈, '아이러브커피'의 파티게임즈처럼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발력은 둘째 치고 다양한 마케팅 노하우와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대기업을 중소기업이 따라잡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게임산업 내부를 들여다보면 혁신 역량이 고갈됐다. 게임업체는 1000개가 넘지만 매출 절반 이상을 3N이 가져간다"며 "초대형 업체들이 게임 개발 재투자에 인색하고 중소업체들은 자금난에 투자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현재 상당수의 중소기업은 게임 서비스를 위해 대기업 혹은 퍼블리셔의 힘을 빌리는 처지다. 자체 서비스는 꿈도 꾸지 못한다. 대기업 중심의 시장 고착화는 현재진행형이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업계도 사실상 돈이 돈을 부르는 상황에 이르렀다. 게임 하나 성공해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일은 이제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며 "혁신이 없으면 전진할 수 없다. 게임업계 전체가 현재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