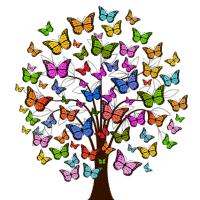유아를 대상으로 종이가 만들어 지는 과정을 교육하고 싶은데요
나무에서 종이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사진이 간단하고 쉽게 되어 있는 자료를
구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 한지, 그 천년의 비밀을 뜨는 사람 | 세월속에 흔적 | 2005/03/31 10:36 | ||||||||||||||||||||||||||||||||||||||||||||||||||||||||||||
| http://blog.naver.com/point2226/40011743153 | |||||||||||||||||||||||||||||||||||||||||||||||||||||||||||||
| 현존하는 인류 최고(最古)의 인쇄물 1966년 10월, 불국사 석가탑 사리함에서 작은 종이 뭉치가 발견되었다. 폭 8cm 길이 620cm의 긴 종이를 말은 것으로 한지에 목판으로 찍은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었다. 이 다라니경은 현존 최고(最古)의 인쇄물로 습기찬 석탑에서 1200년을 지냈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종이 질을 유지한 채 발견되었다. 서양문명의 자존심인 쿠텐베르크의 금속활자로 찍은 '42행 성서'는 부식으로 전시조차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고려의 종이에 찍은 '직지'는 지금도 책장을 넘길 수 있으며, 신라의 다라니경은 아직도 전시가 가능한 상태이다. 쿠텐베르크 성서는 약 550세, 직지는 628세, 다라니경의 나이는 최소 1200세이다. 천년을 사는 한지의 신비로운 비밀의 열쇠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한지를 '창호지' 정도로 가벼이 불러도 좋은가.
먹고 살아야 종이도 뜬다. 무조건 전래 방식으로 한지를 뜨라는 것은 한지 업체들에게 종이 뜨기를 그만두라는 말과 같다. 많은 한지장들이 수지타산이라는 현실에 묶여 변형된 재료와 생산 방식을 따르고 있어 자연히 종이의 질이 떨어지고 있으며, 저질 저가의 수입 종이도 넘친다. 서울 인사동에선 한 장에 팔백원부터 이만여원까지의 종이들이 모두 '전통 한지'로 팔린다. 이런 판에도 많은 한지장들이 새로운 기법과 아이디어로 국산이든 수입이든 오로지 순수하게 닥나무만을 원료로 떠내는 '한지'는 그 예술성에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는 '작품'들이 많다. 노(老) 한지장들은 지금도 '조으'라는 옛 말을 상용어로 쓴다. '종이'는 많으나 '조으'는 드문 이 난장판에서 우리의 소중한 재래식 한지 제조 기술은 거의 숨을 거두어가고 있다. 문경골의 한지 뜨기 3개월이 넘게 재래의 방법으로 종이를 뜨는 곳이 있는가 수소문하였다.
가성소다가 덜 빠진 펄프를 씹었다가 혀를 덴 일도 있었지만 기자가 종이를 구별하는 가장 확실하고 냉정한 방법은 종이를 먹어보는 것이다. 김 장인의 한지가 이에 씹히는 첫 순간에 기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종이는 이전에 먹어본 어느 종이와도 달랐다. 질기면서도 부드럽고, 짧은 듯 긴 전통 한지 섬유의 특질이 그 종이엔 모두 살아 있었다. 유연한 듯 강한 한지의 특질은 우리 민족성에 비유되기도 한다. 한지만으론 생활이 빠듯해 농사와 한우 치기를 겸하면서도 좀더 편리한 방법, 쉬운 재료에 눈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스승(고 유영운. 김 장인의 매형)에게서 배운 전래의 방식 그대로 '조으를 뜨는' 그의 고집은 일종의 신념이었다. 닥 펄프를 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을 뜨는 그의 종이가 탁월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김 장인의 흙가마는 증기를 내기 위한 물을 담는 부분만 철판이고 나머지는 모두 흙이 재료다. 흙으로 만든 거대한 욕조 모양으로 키 높이보다 약간 높게 사방 5m의 정방형이다. 오랫 동안 쓰던 옛 가마가 낡아서 지난해 새로 지었다는데 단순히 흙과 돌을 쌓는 일이 아니라는 아들의 말이다. 오전 6시부터 땐 불을 무려 8시간 계속하고 오후 2시 반에 껐다. 한 시간쯤 뜸을 들인 후 3시 반에 세 겹의 비닐 커버를 벗기니 훈김이 몰아친다. 그 냄새가 고구마 삶는 냄새와 아주 흡사하여 일부러 가까이 냄새를 맡아보았다. 이렇게 한 번 쪄내는 것을 '한 솥 찐다'고 한다는데, 보통 500관(2000Kg) 정도씩 5~6회를 찌어 일 년 쓸 닥을 채비한다. 재래식 닥삶기는 밭에 큰 구덩이 두 개를 파고 쪄내는 방식이지만, 요즘은 그런 방식으로 닥을 삶는 곳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스승에게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할 뿐이라는 김 장인의 말은, 전통의 고수가 매우 단순하고 쉬운 이치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유명한 한지 업체를 방문했을 때는 작업장 전체에서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해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절대로 화학 표백을 않는다는 김 장인의 설명이 따로 필요 없이 생산된 종이를 보면서 기자는 대번에 그것을 알아챘다.
메밀대는 속이 대나무처럼 비어서 태운 재의 양이 매우 적다. 한 해 동안 쓰려면 농협에서 나온 40Kg들이 수매자루로 10자루의 재가 필요한데 한 트럭 정도의 메밀대를 태워야 그 정도의 재가 나온단다.
역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과정이다. 잘 쳐댄 닥죽은 특유의 빛깔과 미끈거리는 감촉을 낸다. 사진의 돌('딱돌'이라 부른다)은 김 장인과 40년을 같이 한 돌로 아들 김춘호씨에게 물려질 것이다.
닥풀은 이 과정에 없어서는 안 되는 첨가물인데 닥풀로 무엇을 쓰느냐는 종이의 치밀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섬유 안정제'다. 닥풀을 섞지 않으면 섬유가 자꾸 물 밑으로 가라앉아 작업도 어렵다. 닥풀의 원료로는 '황촉규'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나오는 끈적거리는 액을 주로 쓴다. 종이 섬유를 뜨는 발은 결이 고운 대나무 발인데, 어떤 발을 쓰느냐도 종이의 성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물질 순간에 팔에 느껴지는 감촉으로 생산하려는 종이의 무게를 1g단위까지 예측하여 균일하게 맞춘다. 고도의 숙련이 요구되며 오로지 세월의 지혜가 쌓여야 하는 한지 제조 기술의 절정이다. 사진에서 보이는 사각통은 맘 먹고 돈을 들여 춘양목을 두껍게 켜서 짠 것으로, 작업내내 물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좋은 종이를 위해 김 장인은 여름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첫 추위가 올 때 닥을 삶고 추위가 가시며 물질을 시작하는 전통한지의 제조는 철저히 자연의 순환에 의존한다. 이른 봄 얼음이 풀리며 녹은 물을 쓸 때 최고의 종이가 나오는데, 그 물의 온도는 최적의 종이를 위한 물 온도인 영상 4~6도에 거의 일치한다.
그의 종이는 시각적으로 거칠다. 이 점은 김 장인의 종이를 "나쁘다"고 말하는 결정적인 요소이지만 김 장인은 그렇게 말하는 이가 종이를 가져오면 돈을 다시 내어주고 종이를 되받는다. "조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조으가 전통의 조으라고 강조하고 싶지도 않고 그저 내 조으를 아는 사람들이 날 찾아주면 그기 행복한기라요"라고 한다. 주변에 흔한 복사지는 30초 정도 씹으면 죽 같이 갈려버린다. 기자는 김 장인의 한지를 씹다가 결국 뱉어냈다. 씹어보는 방법이 한지 판별의 전부는 아니지만, 씹을수록 단단히 뭉치는 그의 종이는 '잘못 씹으면 이가 부러지는' 전래 한지의 특질을 그대로 지녔다. 그러나 한지를 쓰는 전문 작가들 상당수는 그의 종이를 '나쁘다'고 한단다. 그들이 접해본 종이는 거의 양지에 가까운 한지였으니, 붓이 흐르는 감각이나 먹이 스미는 감각이 지금까지 접하던 종이와는 영 다른 김 장인의 종이는 당연히 '나쁜 종이'였을 법하다. 아들 김춘호씨가 아버지의 대를 잇겠다고 했을 때, 김 장인은 무조건 4년 이상 도시생활을 할 것을 명하고, 편한 세상의 맛을 보고 나서도 종이 뜰 생각이 나거든 들어오라 했단다. 대학(전자공학과)을 마친 김춘호씨는 아버지이자 스승께서 내건 조건대로 도시 생활 딱 4년만에 종이를 뜨겠다고 다시 나타났다. 잘 나가던 직장을 접고 험한 종이 뜨는 일을 하겠단 아들을 붙들고 김춘호씨의 어머니는 울며 말리셨단다. 김춘호씨는 아버지의 염려보다는 훨씬 진지하게 전통 한지를 지켜내는 일의 중차대한 의미를 마음 속에 깊이 새기고 있다고 기자는 느꼈다. 지난 1월 1일 새벽에 혼자 소백산에 올랐다는 김춘호씨의 다짐이 궁금하다. | |||||||||||||||||||||||||||||||||||||||||||||||||||||||||||||
2005.04.04.
-
채택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
출처
네이버 포스트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